기억을 들추었다.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다.
이거였던가 싶다. 어렵지도 않은 단어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 단어들의 테두리를 따라 걸었다.
무언가 그 테두리 안에 있은 것 같다.
재조합은 어려워서 그대로 인용한다.
『롤랑 바르트, 밝은 방』 박상우,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전자책)
바르트는 사진의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학문. 비평. 언어. 과학에 의지하지 않는다.
대신 '나'와 '감정'을 사진을 판단하는 최종 준거로 삼는다.
그는 촬영자 대신 보는 자의 관점을, 보편의 학문 대신 개별 학문을, 객체의 과학 대신 주체의 과학을 추구한다.
바르트의 연구 방법은 '정서'를 도입한 감정의 현상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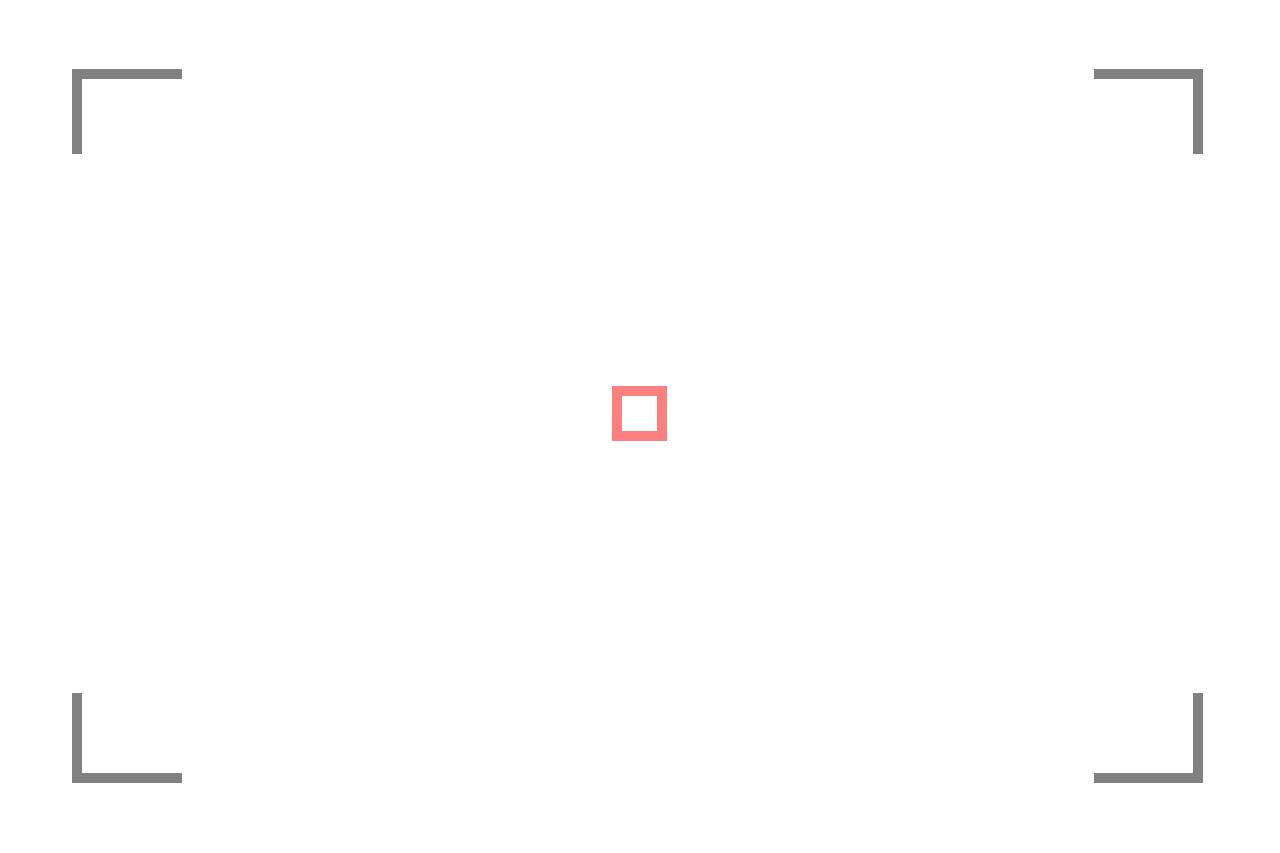
사진이 보는 자에게 유발하는 의식(conscience)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진은 대상이 '거기에-있음'이 아니라, '거기에-있었음'이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유사함을 재현하는 모든 매체가 유발할 수 있는 의식인 '거기에-있음'이 아니라, 사진만이 촉발할 수 있는 의식, 즉 '그것은 과거에 거기에 실제로 있었음'이라는, 과거의 실재성이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바르트를 사로잡은 사진들은 모두 '이원성'이라는 구조적 법칙을 가진다.
이원성이란, 의미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요소이다...(중략)....
스투디움은 문화에 바탕을 두고 익숙하게 체험 하는 평균 정서이다.
푼크툼은 감정에 구멍이나 상처를 내는 정도의 정서적 충격이다...(하략)
* 스투디움; 일반적인 흥미의 감정
* 푼크툼; 외상을 불러일으키는 감정

사진의 특수성은 지시체의 특수성이다. 사진의 지시체는 제작 당시 카메라 앞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바르트는 지시체의 실재성에서 사진의 본질인 '그것이-존재-했음'을 도출한다. 이 테제는 '그것이' 그때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없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사진은 절대적 인증의 힘을 지닌다.
사진은 역사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사진에서 광기는 '그것이-존재-했음'에서 유래한다.
광기는 그것이 '그때, 그곳에 존재했음'과 '지금, 여기에 없음'이라는 분할된 환각에서 발생한다.
사진은 광적인 이미지다. 지나간 실재와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광기는 관객이 지시체에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지닐 때 폭발한다.
사회는 예술화와 보편화를 통해 사진의 광기를 다스린다.
장소는 경주였을 것이다.
'작가'도 이 사진이 마음에 드셨나보다. 몇 해 전에 액자로 벽에 붙여놓으셨더라.
원본은 작은 사진 쪼가리인데 어떻게 확대를 하신 것인지.
소년 전(前)의 어린이는 그때도 모잘라 보이고,
여동생은 나중에 짠순이가 된다.
사진은 액자를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다.






글에 남긴 여러분의 의견은 개 입니다.